Steal depression - 구나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rt 댓글 0건 조회 4,781회 작성일 12-01-11 13:29| 작가명 | 구나(GuNa) |
|---|---|
| 전시기간 | 2012-01-07 ~ 2012-01-20 |
| 초대일시 | 2012-01-07 PM 5:00 |
| 휴관일 | 월요일 휴관 |
| 전시장소명 | 플레이스 막(place MAK) |
『 Steal depression - 구나展 』

▲ 구나, Deep sleep, mixed media installation, variable, 2012
전시작가 : 구나(GuNa)
전시일정 : 2012. 01. 07 ~ 2012. 01. 20
초대일시 : 2012. 01. 07 PM 5:00
관람시간 : Open 12:00 ~ Close 20:00(월요일 휴관)
전시일정 : 2012. 01. 07 ~ 2012. 01. 20
초대일시 : 2012. 01. 07 PM 5:00
관람시간 : Open 12:00 ~ Close 20:00(월요일 휴관)
Steal depression
막걸리
나영은 작업실 나무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연탄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 부리에서 수증기가 폭폭 소리 내며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득 고요함이 새삼스러워져 음악을 틀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탕-탕-탕-
“나영! 문 좀 열어줘.”
방으로 들어서던 나영은 재빠르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오랜 친구인 S가 서 있었다.
“어, 왔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왔어.”
“어서 들어와.”
S는 우산을 접어 밖에 새워두고 어깨춤을 털며 들어왔다. 나영이 말했다.
“눈이 많이 오네. 오는데 추웠겠다. 건강은 좀 괜찮아졌어?”
“응,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저번에 이야기 했던 예술가 모임 있지? 그 모임이 오늘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비었어. 이번 모임을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네. 그건 그거고, 곧 전시한다고 했던 네 말이 생각나서 잠깐 들렸어. 차나 한 잔 할까하고, 네 신작이 누구보다 먼저 보고 싶기도 했고 말이야.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 있다가 음악 틀려고 하는데 왔네. 뭐 들을래?”
“조용한 것 아무거나. 눈도 내리는데 멜로디가 있는 곡이면 좋겠어.”
“작품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보여주기 쑥스러워.”
“뭐 어때? 느낌이 중요하지.”
S는 나영의 작업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흰 벽면에 마구잡이로 붙은 메모들과 정리되지 않은 캔버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물감 자국에서 전시에 대한 나영의 고민들이 묻어났다. S는 뒤꿈치에 질퍽하고 밟히는 물감 튜브를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이 그림은 다 그린거야?”
“아니, 아직.”
“아, 그래? 지금 좋은데?”
“그래?”
붓질이 얼마 안 된 작품 앞으로 옮겨 서서 S는 다시 물었다.
“이건? 이거는 미완성이지?”
“아니, 그건 다 그린거야.”
탕-탕-탕-
“나영! 문 좀 열어줘.”
방으로 들어서던 나영은 재빠르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오랜 친구인 S가 서 있었다.
“어, 왔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왔어.”
“어서 들어와.”
S는 우산을 접어 밖에 새워두고 어깨춤을 털며 들어왔다. 나영이 말했다.
“눈이 많이 오네. 오는데 추웠겠다. 건강은 좀 괜찮아졌어?”
“응,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저번에 이야기 했던 예술가 모임 있지? 그 모임이 오늘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비었어. 이번 모임을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네. 그건 그거고, 곧 전시한다고 했던 네 말이 생각나서 잠깐 들렸어. 차나 한 잔 할까하고, 네 신작이 누구보다 먼저 보고 싶기도 했고 말이야.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 있다가 음악 틀려고 하는데 왔네. 뭐 들을래?”
“조용한 것 아무거나. 눈도 내리는데 멜로디가 있는 곡이면 좋겠어.”
“작품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보여주기 쑥스러워.”
“뭐 어때? 느낌이 중요하지.”
S는 나영의 작업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흰 벽면에 마구잡이로 붙은 메모들과 정리되지 않은 캔버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물감 자국에서 전시에 대한 나영의 고민들이 묻어났다. S는 뒤꿈치에 질퍽하고 밟히는 물감 튜브를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이 그림은 다 그린거야?”
“아니, 아직.”
“아, 그래? 지금 좋은데?”
“그래?”
붓질이 얼마 안 된 작품 앞으로 옮겨 서서 S는 다시 물었다.
“이건? 이거는 미완성이지?”
“아니, 그건 다 그린거야.”

▲ 구나, What would you do to the errors of the pass...?, oil on wood, 70x80cm, 2012

▲ 구나, A high Temperature in September., oil on cloth, 50x55cm, 2012
S는 나영의 모호한 완성과 미완의 경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S는 나영이 자신과 아주 유사하다고 느꼈다. 사실 완성과 미완의 경계에 대한 확신의 부재는 자신이 곡을 완성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이기도 했다. ‘형식적으로 불안정하다.’, ‘S의 곡은 다른 곡에 비해 마디수가 늘었고, 악구의 길이가 불규칙해서 형식미가 떨어진다.’등의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다. S는 보헤미안적인 일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음률에 그 일상적인 자유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다. 자연의 풍경을 리듬으로, 인간의 감정을 멜로디로, 문학에 대한 애정을 화성으로 사용했다. 바람의 소리, 물소리, 새 소리는 음이 되어 낭만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정연한 형식은 S가 선율에 실어내고 싶은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전통일 뿐이었다. S는 무엇보다도 진보적인 형식을 갖추고 표현이 가진 내적 필연에 의해 조응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S는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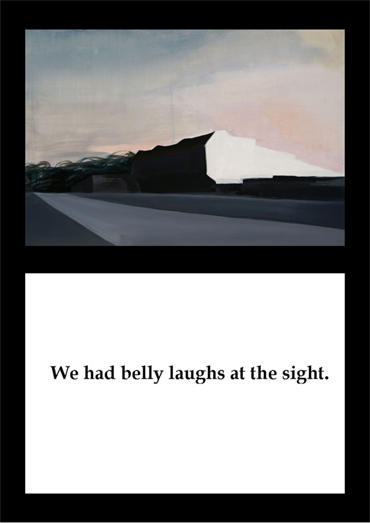
▲ 구나, We had belly laughs at the sight., acrylic and oil on canvas, 50x73cm, 2012
“나영! 어떤 게 다 그린 거고, 어떤 게 다 안 그린거야?”
“음... 다 완성된 건 이거랑 저기 저거.”
“이거?”
“아니, 그 옆에...”
“아... 그래?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네.”
“응. 부지런히 해야 돼.”
작은 나무의자에 앉으며 S가 말을 이었다.
“난 곡을 다 쓰고 나서 일부러 불완전한 구조를 만들어. 뭔가 형식적으로 완전해지면 곡에 실고 싶던 느낌들이 증발하고 소각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구조를 흐트러뜨리고 다시 연주해 보면 마음에 들 때가 많아. 사실 이번에 새로 쓰고 있는 교향곡도 1악장과 2악장만 남기고 다 찢어버렸어. 2악장만으로도 그 교향곡은 충분해.”
“어, 맞아! 나도 마저 그리지 않아. 필요해도 필요하지 않아. 필요에 의해 완성하고 나면 뭔가 꾸며진 느낌이야. 내가 그림에 담고 싶었던 느낌들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해.”
“.....”

▲ 구나, Shipwreck, oil on cloth, 120x134cm, 2011
S는 한참동안 말없이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나영은 난로 옆에서 바짝 마른 수건을 접어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무슨 생각해?”
“작품 좋네.”
“진짜?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 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조금 괜찮아지네.”
나영은 S의 친절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생각에 빠진 S는 나영의 작품이 시작되는 영감의 원천이 궁금해졌다.
“나는 곡을 쓸 때 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가곡의 가사에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시는 정말 황홀해. 실러, 오시앙, 게르너, 셰익스피어 가끔은 글룩의 희곡이나 그 중에서도 마이야 호퍼의 시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시인은 정말 대단해. 나영은 주로 영감을 어디서 받아?”
“영감? 때때로 달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한테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 나 자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 나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냥 그렸어. 아무생각 없이 그리고 나니까 자질 구리한 감정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보이더라. 너무 과하게 담겨버렸지. 그 쌓여있는 감정들을 보면서 다시 괴로워졌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거북해. 괴롭던 감정들을 한참동안 게워내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히려 그것들은 내가 아니기도 했지. 뭔지 모를 것들이 나라면서 덩어리로 나에게 날라드는데 나는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내기 힘들었어. 열다섯이었나? 아마 여름이었을 거야. 땀에 살짝 젖은 교복을 입고 쇼파에 앉았는데 당시의 날씨, 거실의 습기며 쇼파에 살이 닿는 감촉이 TV에서 나오는 영상과 너무 잘 어울렸어. 영상은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받아내고 있는 프라하의 풍경이었지. 그러고 보니 다른 것보다도 영상이나 영화에서 주로 받는 것 같네. 특히 영상이 담아내는 분위기의 조화로움...”
“아, 그러고 보니 네 그림에서 동유럽의 차가운 바람 같은 것이 느껴져. 분위기라... 맞아. 나도 기억 속의 인상적이었던 분위기를 음색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 분위기가 담았던 모든 요소들을 선율에 담고 싶어지지.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놓칠까봐 작업하는 내내 애가 타고, 다시 떠올릴라치면 미칠 것만 같은 복잡하고 이채로운 분위기.”
나영은 자신의 작품에 담긴 것들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S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림 속에 여과 없이 담겨진 사적인 기억으로 인해 내 감정은 다 증발해버렸어. 결국 나의 기억과 사적인 이야기들은 작품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야. 내 감정에 대한 환멸은 그림에서 정리되지 않았고 난 지쳐버린 거지. 그 후로는 그림에 사적인 것이 담기는 것을 배재하고 있어. 그래서 대체제로 나의 감정들과 유사한 이미지를 빌려오기 시작했지. 일상은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니까... 객관적인 일상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작위적으로 감수성을 만들어 내. 선택된 이미지에 내 감정들을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적인 경험 안에서 나의 감정을 붙잡았다면 지금은 객관적인 이미지들에서 내 감성을 잡아내 나만의 색이나 형태로 표현하는 것 같아.”
“불완전함 그것이 주는 완전함.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의 교향곡에 대해서 불완전하다고 말하겠지만, 상관없어. 어찌됐든 그 곡은 완성이니까.”

▲ 구나, At the airport, oil on canvas, 95x110cm, 2011
나영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우유를 데우기 시작했다. 아무 약속도 계획도 없는 휴일, 포근한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창 밖에 내리는 비를 우연히 보게 되는 것 같이 편안한 홍차향이 작업실 전체에 퍼졌다.
“밀크티 괜찮지?”
S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훔친 멜랑꼴리네.”
“훔친 멜랑꼴리? 멜랑꼴리를 훔쳐왔어? 내가?”
나영은 S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머그잔에 담긴 밀크티에서는 긴 곡선의 김이 솟아나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말해줘. 그러고 보니 나에게 멜랑꼴리는 태생부터, 원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불안증은 딱히 이유가 없어. 극도로 치밀어 오르는 듯 한 우울이나 침울함이 아니라 배꼽 밑에서 미세하게 감지되는 불안함, 차분한 우울함 같은 거야.”
“그래. 본질적으로 우울함을 안고 살아갈 운명. 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객관적인 이미지들을 차용했잖아? 어느 누군가의 일상적인 느낌. 매번 바뀌는 감정의 변화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뒤집어 씌워 어디서 온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했지만 너는 알고 있지. 예를 들어 도둑을 맞은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훔친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훔친 것이 무엇인지.”
밀크티가 얼마나 천천히 식고 있는 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지극히 평범한 오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작업실 창틀에 맺힌 엷은 서리처럼 평화로웠다. 나영은 S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타블릿피시를 꺼내들었다. 하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타블릿피시에서 영상과 함께 세르주갱스부르의 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장면 낯이 익은데?”
S는 나영의 영상이 시작된 후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에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뭔지 알겠어?”
“아니. 언젠가 본 듯한데 모르겠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야.”
“영화라고 하니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계속 반복했어. 대신 장면과 장면 사이의 간격을 다양하게 조절했지. 시선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 같은 장면에 대한 다른 시선들.”

▲ 구나, Relation of insecurity, video, 5:26, 2012
머그잔 속의 밀크티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림 사이에 시계 바늘은 많이 움직여 S가 작업실로 들어왔을 때와 전혀 다른 각도로 서 있었다. S가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머! 왜 이렇게 빨라?”
“그러게, 오늘 너무 즐거웠어. 전시 전까지 그림을 다 그리려면 시간이 부족하겠다.”
“응, 열심히 그려야지. 며칠 동안은 밤 새야겠다.”
“그래. 즐겁게 해.”
“응.”
“어떻게 가?”
“조금 걸으려고 걷다가 너무 추우면 버스 탈거야.”
“그래, 조심히 가. 빙판길 조심하고...”
“응, 안녕.”
“안녕.”
나영이 작업실 안에 데워진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복하게 내린 눈은 햇살에 젖어 땅을 적시고 있었다. S는 어깨를 움츠리고 눈 녹은 길을 걸었다. 작업실 안에 흐르던 음악의 마지막 마디가 나영의 도톰한 귀 볼에 맺혔다. 나영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S를 확인한 후 현관문을 닫았다.

▲ 구나, Deep sleep, oil on wood and installation, 42x90cm(painting size), 2011
작곡에 몰두하던 S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예술가 모임인 슈베르티아테에 참석하지 못했던 S는 몸이 좀 나아지고 난 후에 모임이 잡히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모임 당일 눈이 내리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 됐고, 그 덕에 나영과 S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영은 S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다. 언제나 따듯하고 친절한 S가 건강해지길 바랐다. 그 후 한동안 나영과 S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영의 전시를 축하한다며 배달된 S의 작고 수수한 화분 하나만이 그가 어딘가에 숨 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얼마 지나 나영은 다른 친구에게 S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S는 끝내 앓고 있던 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 친구는 죽기 직전 S가 베토벤이라고 착각하며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한 장소가 남아있는 지 묻는 착란을 일으킨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사람들은 S가 남긴 불완전한 악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연구를 거듭했다. 나영은 S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완성과 미완성의 경계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지어 왔나? 이번에도 그녀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영은 자신 안에 내재된 이유 없는 불안이 ‘마저 표현하지 않게 하는 반항’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S가 마지막으로 작업실에 찾아왔던 날 이야기 나누었던 미완성 교향곡(Schubert Symphony No.8 ‘Unfinished’in B minor, D.759)에 대해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악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휘어잡기 때문에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추천0
- 이전글내려놓기 - 이윤진展 12.01.12
- 다음글MUTATION-돌연변이 12.01.10
 admin님의개인전소식 관련글
admin님의개인전소식 관련글
- H인기글 《박광진: 자연의 속삭임》 12-16
- H인기글 신은섭 fine tree 올려보기 10-18
- H인기글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달 07-25
- H인기글 <삶 - 여정> 07-22
- H인기글 촉발 affect 소영란 07-10
- H인기글 김동수 개인전 <행행전> 07-08
- H인기글 권숙자 초대전 <이 세상의 산책> 06-26
- H인기글 바람이 그린 그림 06-20
- H인기글 강미선 개인전 06-05
- H인기글 김화수 초대개인전 06-05
